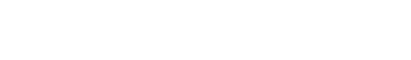도가니의 분노
정채환 코리아나뉴스 발행인
작가 공지영의 실화소설 ‘도가니’가 영화화 되어 전 국민이 분노하며 어두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새기록을 갈아치웠다. 영화는 2000년부터 2005년사이에 청각장애인 학교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다.
오랜기간에 걸친 성폭행 사건이 결국 그 전모가 드러나지만 고발인과 피해자의 신분차이로 유야무야로 넘어간다. 교장을 비롯한 학교의 고위급 실력자들이 외부의 경찰, 검찰, 상부 교육기관 등과 결탁하여 부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약자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즉 ‘광란의 도가니’였다. 이게 어디 학교 뿐이겠는가? 사회 곳곳에 은밀한 거래가 작동되고 끼리 끼리 어울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형성한다. 더구나 장애인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고 편견과 선입관이 작용하기 쉽기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더 크다. 또한 지방에선 토호세력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권력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기 마련이다. 천하가 자기 손안에 든 양 기고만장이다. 실제로 오랜 이웃으로 살아가니 서로를 무시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실제의 반도 표현하지 못했다
작가 공지영은 원작이 실제사건의 반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한다. 워낙 사건이 끔직한 게 이유라는데 영화는 또 원작의 반만 영상화 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끔찍했나 하는 게 미루어 짐작이 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여론이 분분하니 법을 개정하느니, 재수사를 한다느니 분주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납득이 가는 보편적인 재발방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검사와 스폰서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검사가 성접대를 수시로 받고도 유유히 빠져 나가는 세상이다. 일반 서민은 이런 세상을 보고 허탈감이 솟아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도 해친다.
최근 SLS 이국철 회장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권력의 실세에게, 돈을 주고 향응을 베풀었다는데 그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믿기지가 않는다.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이라 누구도 근접이 불가능한 탓이다.
바른세상이 와야
가지고 힘있는 사람만 살기 좋은 한국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암묵적 칼텔이 형성되어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횡포가 심하다. 학연으로 이어진 선후배, 지연으로 얽혀진 선후배, 직장에서의 전관예우와 같은 끈끈함이 또 다른 부패를 형성한다.
‘도가니’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부패경찰과 지역 유지인 사학재벌, 전관예우 대우를 받는 변호사가 한 통속이었다. 영화의 고발이 있어 망정이지 자칫 그냥 넘길 사건이었다. 서민들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일이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며 언젠가 나의 일이 될지도 모를 환경을 미리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의 일로 돌아 와 주변의 도움이 절실해 진다. 그럴 때 외면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작은 정의감이라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가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쥬는 물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