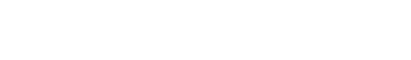하지만 대형 마트는 해로운 괴물이 아니다. 재래시장에만 많은 상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형 마트 안에서도 지역의 수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급료를 받고 있으며, 동네의 식당 주인들이 푸드 코트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기른 농산물이 소비자를 만나는 곳이며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형 마트 브랜드를 달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곳이다. 대형 마트는 이른바 거대자본을 활용해서 그런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묶어낸 것이다.
대형 마트의 문을 닫으면 마트 주인인 재벌가만 손해를 보고 말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마트 안의 근로자와 식당 주인과 농민들과 중소 납품업체들이 모두 손해를 본다. 무엇보다도 좋은 쇼핑 환경에서 좋은 물건 싸게 사기를 원하는 지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
동네슈퍼, 재래시장에 반사이익을 주기 위해 대형 마트의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이익은 희생돼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유통업의 발전을 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따지고 보면 지금의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도 한때는 낡은 산업을 대체하며 나타난 신산업이었다. 원래 이 땅의 유통업은 5일장과 장돌뱅이가 전부였다. 소득이 늘면서 상설시장이 커져갔고 그곳의 상인들이 결국 5일장과 장돌뱅이 봇짐장수들을 대체했다. 1960년대부터는 점방 또는 구멍가게라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점포들이 골목으로 들어와 재래시장의 몫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 구멍가게들이 지금과 같은 동네슈퍼로 대체된 것이다. 이제 소득 2만달러 시대에 맞춰서 유통업이 또 다시 고통스러운 껍질 벗기의 과정을 시작했다. 대형 마트와 SSM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사실 유통업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부문은 대형 마트가 아니라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이다.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은 소비자들이 결정한다. 아궁이 불에 의존하던 난방 방식이 연탄 난방을 지나서 보일러나 지역난방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연탄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탄광도 문을 닫았다. 또 그 과정에서 연탄공장 주인과 근로자, 탄광의 광원 등 난감한 처지의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이 그들의 일자리 보호에만 열중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탄을 때고 있었을 것이다. 변화가 올 때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일을 찾고 만드는 것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의 숙명이고 사명이다.
지금의 동네 상권이 그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들이 변했기 때문이다. 벽에 붙였던 껌을 떼서 다시 씹어도 멀쩡하던 예전의 그런 소비자들이 아니다. 조금만 유통기한이 지나도 질색을 하는 사람들로 변했다. 그런 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믿을 만한 상점을 원하고 있다. 비가 오든, 춥든, 덥든 상관없이 쾌적하게 쇼핑하기를 원한다. 부부가 같이 나들이 삼아 쇼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유통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형 마트 안에도 수많은 소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다. 기존의 동네 상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변화된 소비자들의 욕구에 보다 충실히 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 주민들이 마트로 발길을 돌렸을 리 없다. 그런 마트를 막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다. 현명한 정부라면 그들을 막기보다 동네 상인들의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