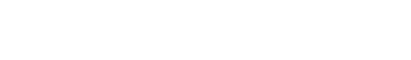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변화시키고, ‘고래도 춤추게 하며’ 식물까지도 잘 자라게 하는 게 뭘까. 좋은 말을 해 줄 때 밥은 오래 보존되고, 물은 건강한 상태로 변하더라는 보고도 있다. 이 때문인가. 우리들은 칭찬의 홍수 속에 산다.
지나치며 쉽게 하는 인사말 같은 칭찬과 달리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깃거리를 갖고 싶은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뭐 하시는지 여쭤 봐도 되요?” 내 또래쯤 될까, 더 젊을까. 서래섬 둘레를 힘차게 걷던 여자분이 멈춰 서며 내게 물었다. 마포대교 쪽의 하늘이 보랏빛에서 짙은 회색으로 바뀔 때, 길어 온 물을 뿌려가며 분꽃이며 코스모스, 접시꽃, 국화 등의 잎을 씻고 있을 때였다. 장맛비가 넘쳐 흙옷을 두껍게 입은 꽃들이 숨 못 쉬어 죽을까 봐 씻어 준다 했더니, 서래섬 관리자가 호스로 물을 뿌려 씻어 줘야지, 왜 내가 씻느냐 한다. 쫄쫄 흘려가며 씻는 것이 시원찮아 보였을까. “심은 사람이 씻어 줘야죠, 관리소 측에선 풀만 깎고 이런 일은 관심 없어요.” “관리소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서래섬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꽃밭을 가꾸시는 거잖아요. 제가 꽃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으니 시를 낭송해 드려도 될까요?” 한참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뜸 시 암송의 제안이라니.
“저 한 사람을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 시를 읊어 주는 황송한 호사를 누려도 될까 주저되었지만 사양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용기를 내서 말했을 텐데. 그이는 둘레길 한쪽에 서더니 나를 향해 서서 목을 가다듬었다. 나도 그분을 향해 가만히 두 손을 모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는 강가, 다부진 모습의 검은 실루엣에서 깊이 있는 소리가 울려 나온다. 약간 허스키해서 다감하게 느껴지는, 힘 있는 목소리가 때론 여린 음성이 되어 마음을 두드리고, 풀잎 둔덕 위를 구르더니 강물에 누운 가로등 불기둥을 흔들고 올림픽대로의 차 소리도 잠재워버렸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잠시 멈췄었다 했지만 나는 몰랐다. 한 곳도 되풀이되거나 멈칫거림 없이 계곡물처럼, 때로는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들려주었다.
수양버들과 잡초만 무성하여 심심한 섬 둘레를 꽃도 좀 보며 걷자고 한 일인데, 시를 듣게 되다니. 보답으로 시 한 구절이라도 기억해 두려 했는데 마음이 달뜬 때문이었을까. 시가 길었기 때문일까. 시 구절은 고사하고, 시의 제목도 시인의 이름도 밤하늘처럼 깜깜 해버렸다. 어두움이 둘러싸 준 효과가 한몫을 했나. 삶을 관조하는 시가 대부분 그렇듯, 마음을 침잠시키고 좀 쓸쓸하다는 분위기와 함께 알싸한 감동만 남았다. 슬픈 느낌을 준다는 내게 그이도 동조했다. 떠날 것을 예감했는지, 계곡의 급류에 쓸려 작고하기 전에 쓴 시라고 했다. 그이는 시 낭송으로 내가 한 일에 감사를 표했고, 의도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돌아가신 시인을 애도한 셈이 되었다. 시낭송대회에 나간 적이 있는지 물을 뻔했으나 나를 응원하고 싶은 그이의 마음을 평가 절하하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긴 시를 흐트러짐 없이, 마치 심사위원 앞에 선 것처럼 정성 들여 암송해 주어, 도리어 감탄해 드리고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되었지 않은가. 어두워서 잎 씻어주기를 마치고, ‘제가 다 못 씻은 것은 빗물로 씻어주세요,’ 하늘을 보며 이야기했더니 그이가 웃었다. 낭송한 그이도, 들은 나도 한마음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워 서래섬 둘레를 같이 걸었다.
그이는 동화구연을 배워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을 사장하는 게 아까워 어린이집 동화구연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고 했다.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 두 곳의 동화 들려주는 선생님이란다.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 가을, 입주와 함께 개원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서 동화를 들려주겠다고 했단다. 재건축하는 동안 임시 살던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를 맡아 이뤄냈던 일도 몇 가지 들려주었다. 며칠 전 새 아파트에서도 동 대표 선출에 나섰는데 지지를 못 받았다 하였다. 자매님의 열성과 능력을 아직 보지 못한 까닭이라고 했더니 나이 든 여자라고 젖혀 놓았을 거란다. 나이와 성별의 장벽을 느낀다면서도 봉사할 곳을 찾아 나서는 열성 당원을 놓치다니. 옆 동네 아파트 주민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짐작이나 할까. 나는 꽃을 가꾸다 만난 형제님도 잊지 못한다. 지난해 봄, 모처럼 비가 온 다음 날이었다. 걸음을 멈추고 꽃을 심는 것을 보더니 정말 좋은 생각을 했다며 함께 가꿔도 좋겠냐고 물었다. 물론이라며 반겼더니 코스모스를 심어 놓고, 잡초를 뽑아 놓고, 비료까지 주었다. 그분이 올해도 다녀가셨나.
혹여 돕겠다고 했던 또 다른 분일까. 물길이 생겼고 백일홍이 심어져 있고 잡초도 뽑혀 있었다. 이 분은 남이 시작한 일을 참여로 발전시킨 분이리라. 이분들을 보면서 촛불집회에 동참하는 수많은 시민의 물결이 떠오르고,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전 대통령도 생각났다. 보이지 않는 정적인 ‘양심’을 ‘행동한다’는 동적인 어휘로 수식했기에 어법에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도치법인지 강조법인지 아무려나, 바른 마음인 ‘양심’을 ‘행동’으로 옮겨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자는 의미라 했다. 군사독재 시절, 무서워 움츠러들어 아무 일도 않으려 드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낭송하신 분도 ‘행동하는 양심’인가. 생각을 곧 행동으로 옮기니 말이다. 고마운 일이구나 싶으면, 배운 것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눈에 안 차는 일이 보이면, 곧바로 나서지 않는가. 시 낭송이나 동화구연의 재능기부로, 발로 뛰어 동네를 돌아보는 일로. 저절로 기회가 굴러올 때에나 남을 위해 일하는 소극적인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하고 싶은 일에 마음과 시간을 내고, 하면 좋은 일을 생각에서 멈추고 마는 것은 나이 들어도 고치지 못하니 고질병 수준이다. 위로나 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기 드는 일이 늦어 기회를 놓치거나, 아픈 사람을 찾아보겠다는 생각만 하고 못 하는 일 등이 부지기수다.
행동으로 재빨리 옮기는 일에 마음을 다잡으면 더 어른다울까. 마음속의 착한 생각도 행동을 입혀야 사람 노릇을 하고, 금고 속의 천만금도 햇빛을 보게 해야 경제가 돌든, 이웃을 돕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닐지. 지나가며 하는 칭찬은 일회성의 작은 미소이고, 거기에 따른 행동은 영속성의 커다란 감동이랄까. 이제부터 나도 행동이 뒤따르는 칭찬과 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시 낭송으로, 함께 가꾸기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본을 보여 주신 것처럼.
약력 ㆍ
<문학미디어>수필등단, 작품상 수상
ㆍ백미문학회 운영이사, 한국문인협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