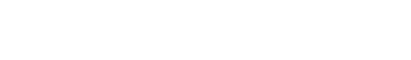110분 내내 거의 퇴장 없이 무대를 이끌어 가는 두 명의 ‘제인’은 김이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두 언니 다 정말 ‘제인’ 그 자체”라고 말문을 연 김이후는 “(문)진아 언니의 제인은 감정의 폭도, 목소리도 풍부한 제인이다. 무대 전체를 감싸안는 느낌이 들고 나레이터로 극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안정적이다. 쉬폰 케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묘사했다.
임찬민의 제인은 “블루베리 타르트”다. “(임)찬민 언니는 순간순간 섬세하게 내 감정을 끌어올려준다. 그 순간 이끌려서 날 것의 감정이 나오는데 그게 신선하고 놀라울 때가 많다. 덕분에 ‘제인’들만 믿고 이 극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니들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전했다.
김이후 ‘로체스터’의 사랑법 역시 믿음직하고 멋있는 ‘제인’들의 캐릭터와 맞물린다. 김이후는 “제인이 가진 성숙함이 로체스터로 인해 돋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로체스터가 힘든 건 이해가 가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그러나 제인을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진실되고 순수하다. 편견 없이 제인이 하는 말에 흥미를 느끼고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그런 부분이 제인과 잘 맞았던 것 같고, 연기할 때도 제인을 진심으로 정말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분명한 건 연극 ‘제인’이 110분 내내 무대를 떠나지 않는 ‘제인’이나, 16번이나 의상을 갈아입으며 총 7명의 인물을 연기해야 하는 ‘로체스터 외’ 모두에게 결코 호락호락한 작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멀티 배역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만큼 성취감도 높고, 보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렉산더’, ‘아킬레스’ 등을 통해 멀티 배역을 소화한 경험이 있는 김이후는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무대에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한 약속”이라며 “여러 인물이 있는 만큼 정형화된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보다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감정을 느껴야 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순식간에 다른 인물로 변해야 한다는 건 장면에 따라서는 감정의 전환이 그만큼 빨라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슬픈 장면을 연기한 뒤 의상을 갈아입고 곧바로 환한 미소를 지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김이후는 “심각하게 퇴장한 뒤 다음 등장을 기다리면서 혼자 활짝 웃을 준비를 하고 있다보면, 내 모습을 상상하며 나도 모르게 순간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이 정말 재미있다”고 귀띔했다. 덧붙이자면, 김이후가 ‘제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제인과 헬렌이 함께 보낸 로우드 자선학교 시절이다. 그는 “둘 다 어리고 순수하게 얘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이 장면을 첫 손에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