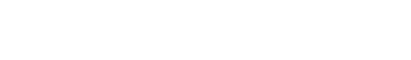1995년에 태어나 지난해 무대에 데뷔한 스물 일곱의 청년 이봉준은 2021년, ‘태일’과 만났다.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 자기 배를 곯으면서도 동생 같은 어린 소녀들을 위해 풀빵을 사주고 청계 6가부터 도봉산까지 걸어 다녔던 사람. ‘태일’을 만난 뒤, 이봉준은 늘 생각한다. “그건 대체 어떤 마음일까?”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삶을 다룬 목소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 ‘태일’에서 태일 목소리 역을 맡은 이봉준과, 태일 외 목소리 역을 맡은 정운선을 지난 4일 대학로 한 카페에서 만났다. ‘태일’은 2017년 트라이아웃을 거쳐 2018년 우란문화재단에서 짧은 기간 동안 본 공연을 진행했고 2019년 전태일 기념관 개관작으로 선정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그 후 약 2년 만에 첫 장기 공연으로 돌아온 ‘태일’은 오는 5월 2일까지 대학로 TOM 극장 2관에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기회를 얻었다.
‘막내’ 이봉준은 어떻게 ‘태일’에 합류하게 됐을까. 이봉준은 “오디션을 볼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다. 준비하면서 ‘태일’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김)국희 누나를 제외하면 다 모르는 선배님들이었고,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 부담도 많이 됐다. 원래 부담 갖지 않는 스타일인데도, 혼자 생각하면서 집 옷방에 들어가서 한 번씩 울기도 하고… 연습 초반에는 리딩하다가 울기도 했다”며 멋쩍게 웃었다.

“이렇게 좋은 선배들, 창작진과 같이 하는구나 싶은 기쁨도 있었고 그런 만큼 결과물도 잘 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고 눈물의 이유를 고백한 이봉준은 “계속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 마음은 조금 수그러들었고, 재미있게 작품을 하면서 고민을 해결해가고 있다”고 미소를 보였다.
“한 사람의 일생을 작품 안에서 보여줘야 한다. 평전을 읽으며 객관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몇 번씩 다시 읽으면서 어디에 내 마음을 넣어야 할 지 고민했다”고 말한 이봉준은 “공연하면서 태일이라는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리고 태일의 상태에 집중해서 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신경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노력은 함께 하는 배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봉준은 태일의 시작부터 함께 해 온 박정원을 비롯해 초연 멤버인 강기둥, 베테랑 진선규 등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태일 목소리를 소화하고 있다. 당연히, ‘막내’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봉준에게는 부담을 이겨낼 무기가 있었다. 성실함이다. 정운선은 ”우리는 (이)봉준이를 정말 예뻐한다.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이봉준을 칭찬했다.
“연습량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중에 봉준이가 연습량은 아마 최고일 것”이라고 운을 뗀 정운선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성실하게 연습하는 친구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자기와의 싸움처럼 말이다. 그래서 봉준이가 울었을 때도 그 모습이 예쁘게 보였다. 우리 모두 한 번씩은 겪어봤던 귀하고 예쁜 마음, 부담되고 욕심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며 “혹시 내가 부족하진 않을까,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걸까, 그런 많은 생각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하는 모습이 예쁜 친구다. 지금 안정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고 우리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존재가 됐다”고 막내를 향한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수많은 노력 끝에 ‘태일 목소리’로 무대에 오르는 지금, 이봉준이 극 전체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면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이봉준이 꼽은 장면은 두 가지다. 첫째는 ‘청옥이 좋아’ 넘버에서 “아버지가 밤새 만든 파란색 빤스를 입고” 부분이다. 이봉준은 “그 부분만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다정한 사람 같지 않나. 아버지는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잘 해보려다가 실패한 뒤 만취해서 가족들에게 폭력도 휘두르던 사람이다. 하지만 태일을 청옥으로 보낸 뒤, 재봉 기술 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것 뿐이라 밤새 파란색 빤스를 만들어 줬다. 밝은 멜로디에, 가을 운동회 만국기가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뭔가 좋더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장면은 ‘마루 밑에서’로 이어지기 전, 태일과 어머니가 재회하는 부분이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어린 아이가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찾아가 드디어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좋다. 대사도 없고 특별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불이 들어와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많은 감정이 느껴진다”고 말한 이봉준은 “어머니 친구 댁의 차가운 마루 밑에서 자는데 무척 추웠겠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태일’에는 극 중 배역이 아닌, 배우 본인으로서 무대에 나서는 순간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원동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간 토크 부분은 역할에 몰입해야 하는 배우들에겐 쉽지 않은 과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봉준은 “오히려 그 부분을 통해 ‘릴렉스’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봉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일 목소리’로 갔다면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느라 힘들었을 것 같다.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됐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이 무척 좋게 느껴졌다. 원동력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만들어주더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이봉준에게 ‘태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물었다. 이봉준은 잠시 말을 고르다 어렵다는 듯 웃었다. “태일이라는 인물이 워낙 본인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다. 안아주고 싶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밥 한 끼, 따뜻한 국물이라도…(먹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어렵게 운을 뗀 이봉준은 “‘본인을 위해서 살라’ 그런 말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굶고 먼 길을 걸어 다닌 그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그저 자신에게 너무 혹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과 존경이 어린 말을 전했다.
*본 인터뷰는 마스크착용, 손 소독, 체온측정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