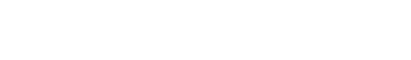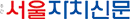지난 11월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전환을 밝혔다. 대상은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로, 정부 부처를 비롯해 공기업, 공단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특히 교육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명신 의원(민주당,비례)에 따르면, 11월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책연구회에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학교회계직) 근로자가 약 4만 2000여명이고, 이에 따라 연간 인건비소요액이 약 5천 6백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종류에는 방과후 교사 10,639명, 인턴교사 및 각종강사 3,009명, 학교보안관 1,102명, 초등 돌봄강사 552명, 영어회화전문강사 1,374명, 조리종사원 5,887명에 이르기까지 46종류, 42,127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처럼 각급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비정규직은 매우 많은 숫자고 예산도 학교와 교육청, 구와 서울시 등 다양한 곳에서 지출되며, 책임소재도 각각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 각급 학교 기간제 교사는 5,007명으로 정규직 교사의 10%를 넘고, 인턴교사 및 각종강사는 3,009명에 달한다는 것.
서울시에서 올해 추진하는 교육관련 사업 중 하나인 학교보안관제도는 현재 4개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 또한 중간업체를 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가 직접 고용하면 일인당 88-90만원이 들지만 현재는 4대 보험과 용역회사 이윤을 포함해 일인당 131만원을 지급한다.
시측은 전문업체 쪽이 위탁이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없는 비정규직 대책 대신에 서울시와 서울 교육청만이라도 교육관련 비정규직을 지원할 고용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법으로서 가칭 교육지원인력관리공단을 신설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양산하는게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는 개선된 양질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