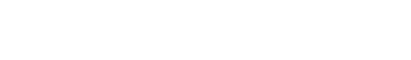Q. ‘병삼’과 ‘주영’은 자신과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고 느끼는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의욱: 저는 병삼이랑 비슷한 모습은 없어요. 아이들 생각은 모르겠지만(웃음) 다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형들에게 들으니 ‘병삼’이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주영’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빠와 화해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족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큰 형님은 가슴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서 가족들을 보여줘야 하는지 고민을 좀 했네요.
박슬기: ‘주영’이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삶을 책임지고 있는, 빨리 커버린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랑은 독립적인 부분이랑 하고 싶은 게 명확하다는 점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점은 ‘주영’이 저보다 착한 것 같아요(웃음)
Q. ‘병삼’이 계속 시를 썼다면 어떤 모습일까?
정의욱: ‘병삼’이 작가인 ‘주영’이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글을 잘 쓰는 걸 보면 굉장히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시를 쓰면서 살았더라면 태평양까지는 아니어도 가족들과 계곡도 가고 소소하게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Q. ‘주영’이 ‘병삼’과 여행을 갔다면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
박슬기 :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아빠의 젊은 시절을 만나면서 마음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인 거 같아요. 물론 여행을 갔으면 정말로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Q. 따뜻한 가족 뮤지컬이 이 시대에 보여줘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정의욱: 가족의 해체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세대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갈등은 분명히 필요한 갈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정리되면 좋겠는데, 이 작품이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박슬기: 따뜻한 가족 뮤지컬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따뜻한 가족 뮤지컬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트라우마나 상처일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Q.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의욱: 와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해요.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오랫동안 공연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나 위안을 줄 수 있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박슬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상한 나라와 함께 성장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공연장에서 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