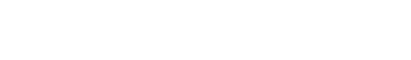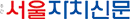각 사회에는 그것을 다른 사회와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각각의 문화가 있다. 마치 각 개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는 면역 체계가 있듯이 말이다. 각 문화는 다른 문화와 많은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앞집과 뒷집이 각각 다른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마는 촛불 켜는 것은 같다.’고 한 것이 그런 것이다.
이 글에서 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문화 인류학에서 말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문화. 즉 그 구성원이 지키고 따르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다. 문화 가운데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있다. 하나의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그 문화를 합친 것이다.
문화의 구성 요소에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다. 하드웨어라면 가정에서는 집과 가구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라면 가족 사이의 호칭, 식탁 예절, 손님접대 방식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것은 대부분 다른 가정도 같거나 비슷하다. 그러나 가정마다 조금씩 다른 점도 있다.
문화는 하나의 축적물이다. 사람들에 의하여 축적되고 사람들에 의해 대체된다. 다른 사회의 문화와 접촉하여 교잡종이 태어나기도 하고 멸종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변소 멀리 내기’는 요 몇 십 년 동안에 거의 멸종되었다. 이런 과정이 문화의 진화다.
진화는 본래 생물학에서 생긴 말이다. 매우 장구한 시간에 걸쳐 한 생물종 체계에서 비(非)목적론적이고 비(非)의도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자연의 선택, 이 두 현상을 합친 개념이다.
복잡계 과학이 말하는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CAS)에서 일어나는 적응(適應· adaptation)이라는 용어는 진화보다는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의 길고 짧음, 의도성의 개입 여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여부도 문제 될 것 없다. 그러나 진화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
문화는 사회의 개체가 아니라 총수(總數·population)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창발특성(創發特性· emergent property)이다. 문화는 진화하는 복잡적응체계다.
사회 가운데는 그 지배적 문화 특성이 다른 사회의 그것과 서로 대립적인 것, 한 쪽이 다른 쪽에 종속적인 것, 서로 조화롭고 상보적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학(大學)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의 맥락에서 보면 가(家)와 국(國)은 신(身)이 발전해 나가는 동일한 직선 위에 있다는 점에서 상보적이다.
그러나 논어에서는 다른 논리가 전개된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자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증언 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자는 다르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 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 주니 정직이란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葉公 語孔子曰 吾黨 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 (논어, 자로(子路) 18)
공자는 가(家)와 국(國)이라는 두 사회가 서로 대립적인 문화 원리를 축(軸)으로 삼는다고 보는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가(家)는 효(孝)를, 국(國)은 충(忠)을 각각 그 축으로 삼는다.
효는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자효(慈孝), 즉 가족 윤리고 충은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의리(義理), 즉 군신(君臣) 사이의 통치 권력의 안배에 관한 윤리다. 사람이라는 요소를 놓고 보면 가(家)는 국(國)의 부분사회다. 그러나 효(孝)와 충(忠)이라는 문화 요소를 놓고 보면 결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타고 누를 수 없다.
공자는 효가 적용되어야 하는 가족 안의 문제에 국가 권력이 침범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오히려 효는 충을 능가하는 윤리라고 본 것이다. 공자의 이 말에는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려는 웅변이 들어 있다.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문화가 다름 아닌 자유다. 서양의 근대는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자유를 말하지마는 원시유교는 가족을 자유의 단위로 삼았다.
진한(秦漢)시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국가 권력은 이른바 오가작통(五家作統,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는 것) 등 방법을 통하여 가(家)를 국(國)의 행정 조직의 안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가(家)의 자유는 그만큼 죄여졌다.
지난 2천년 사이에 동양에서 효와 충은 서로 충돌도 하고 협력도 하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이어 왔다. 국가 사회의 문화는 가족 사회의 문화와 충돌할 수 있다. 충돌하는 것 외에도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하여 무기력화, 면역력 감소, 문화적 질병 전염, 문화 유전자 간섭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 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 주는 가족 사회 문화가 공직사회에 전염된다면 그 결과는 기강의 파괴와 부패의 만연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맹자는 다섯 가지 다른 사회와 그것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지배적 윤리 문화의 축을 오륜(五倫)이라는 말로 기술하였다. 부자유친(父子有親)은 부자(父子)사회의 지배적 문화는 사랑이라는 뜻이다.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 그 나머지다.
맹자가 각 사회에는 각각의 문화 원리가 있다고 서술한 것에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암시가 있다. 한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 원리가 다른 사회의 문화 원리에 의해 침범되어 지배당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혼란 상태가 그것이다.
어떤 남자가 사교계에 나가면 숙녀, 부엌에서는 절약가, 침실에서는 창녀가 되는 배우자를 원했는데 부엌에 들어가면 숙녀, 침실에서는 절약가. 사교계에서는 창녀가 되는 아내를 얻은 것과 비슷한 혼란 말이다.
맹자 시대와는 달리 오늘 날 가장 중요한 자리로 진화한 사회는 시장일 것이다. 시장사회의 중심 되는 문화는 무엇일까.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턴트 정신, 즉 근면, 절약, 정직 등이 자본주의와 친화성(affinity)이 있다고 보았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의 원형정리(元亨貞利) 가운데 정리(貞利)는 시장 문화를 잘 서술한다. 정(貞)은 신용을 지키고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정리(貞利)는 이익은 시장에서만 생기고 정(貞)을 통하여서만 이(利)를 실현할 수 있음을 묘사(描寫)한다.
공자는 정치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한 마디로 대답하여 정(正)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는 올바름의 이끎이 바가 아니라 정연(情緣)의 추동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연, 학연, 혈연, 신연(信緣·신앙과 관련하여 쌓인 인연) 등, 이 연 저 연이 얽혀진 정연(情緣)이 가장 거대한 문화로 작용하고 있다.
연(緣)이 권력이나 돈을 추구하지 않고 연(緣)으로만 남아 아름답게 꽃피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우랴.
정치에서는 연(緣)이 정(正)을 몰아내고 들어서서 권력을 형성하고 그 권력이 시장을 휘저음으로써 정리(貞利)를 구축(驅逐)하거나 멸종시키고 있다. 연(緣)은 한국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의 문화를 감염시키고 있는 악성 바이러스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보는 바, 부정대출, 부정예금인출, 부정감독, 뇌물상납은 모두 연(緣)문화라는 바이러스의 소행이다. 정연(情緣)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대출은 의로운 짓이다. 친지인 고액 예금자에게 예금을 빨리 인출하도록 특별히 알려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짓이다.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내 새끼 돌보기다.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보호의 대가로 충성을 바치는 징표다.
시장 사회의 정리(貞利) 문화, 정치 사회의 정의(正義) 문화, 인정(人情) 사회의 정연(情緣) 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한국에서 어떤 진화의 길을 밟아 갈 것인지 진실로 하회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