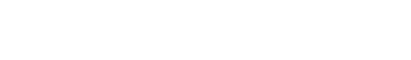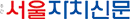국립전주박물관의 ‘작은문화축전’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대보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세시풍속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하여 이를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전통 민속놀이 상설체험마당에서는 대보름 날 달집에 태울 소원문을 써서 금줄에 끼워 넣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 팽이치기, 윷놀이, 투호놀이 등 10여 종목의 민속·추억놀이와 사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선조들이 사용했던 맷돌과 지게 등 생활도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행사기간 중 토·일요일에는 계란꾸러미, 복조리 등 민속공예품 만들기, 떡메 쳐서 인절미 만들기, 브로치 및 부적 만들기, 가훈 써 주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마당이 열린다.
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박물관 내 문화사랑방에서 영화 ‘라푼젤’, ‘리얼스틸’, ‘울지마 톤즈’를 상영하며, 본관 1층 로비에서는 종이를 접어 금동관모를 만들어 보는 ‘금동관모 만들기’를 한다.
2월 10일 설날에는 계사년 새해 새 출발 기념으로 오전 9시부터 본관 1층 로비에서 뱀띠 관람객 선착순 선물 증정을 한다. 오후 2시부터는 세시풍속 관련 퀴즈대회를 열어 퀴즈왕을 선발해 선물을 증정한다. 전통 민속놀이 상설체험마당에서는 전통민속놀이가 계속 이어지며 오후 3시부터는 정문에서 설맞이 온정 나눔으로 ‘떡국 나누기’ 행사가 마련돼 있다.
대보름(2월 24일)에는 풍물패와 함께 박물관 주차장에서 액을 살라내고 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이번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 민족 고유의 명절을 즐기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느껴보고 화합과 나눔의 정을 가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활활 타오르는 달집과 함께 새해 소망을 빌며 희망찬 한해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설
‘설’은 한 해의 시작인 음력 정월 초하루를 일컫는 말로 ‘설날’과 같은 의미이다. ‘설’이 사람의 나이를 헤아리는 단위로 정착하여 오늘날 ‘살’로 바뀌었다거나, 설이 새해 첫 달의 첫 날, 그래서 아직 낯설기 때문에 ‘설다’, ‘낯설다’ 등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설명절은 하루에 그치지 않는다. 설이란 용어 자체는 정월 초하룻날,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 명절은 대보름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설을 ‘설명절’이라고 했다.
설날은 섣달그믐부터 시작된다고 할 만큼 그믐날 밤과 초하루는 직결돼 있다. 끝남과 동시에 시작이기 때문이다. 섣달 그믐날 밤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이를 수세(守歲)라 하는데 옛사람들은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믿었다.
설날에는 세찬의 대표적인 음식인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고 했다. 복을 끌어 들인다는 복조리 풍속도 있다.
‘동국세시기’에 조선시대 도화서(圖畵署)에서는 세화(歲畵)라 하여 수성(壽星)·선녀(仙女)·직일신장(直日神將) 등 액을 쫓는 신(도교적인 신)을 그려 임금에게 올렸다. 또한 도끼를 든 장군 상을 그려 대궐문 양쪽에 붙였는데 이를 ‘문배(門排)’라 한다. 민간에서는 ‘용(龍)’자와 ‘호(虎)’자를 한지에 써서 대문에 붙였는데 이는 모두 궁중의 세화나 문배에서 나온 풍속이다.
설날 꼭두새벽에 거리에 나가서 일정한 방향 없이 돌아다니다가 방향에 관계없이 소리를 들어본다. 이때 까치소리를 들으면 길조이고 까마귀소리를 들으면 불길하다. 설날 밤에는 야광귀라는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어보고 맞으면 신고 가는데 신발을 잃은 사람은 그해에 재수가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에 이런 세시를 행하고 또는 열엿새를 ‘귀신 날’이라 하여 이 날 밤에 신발을 감추거나 엎어 놓는다.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 체나 키를 지붕에 매달아놓거나 혹은 저녁에 고추씨와 목화씨를 태워 독한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정초에 널을 뛰면 그해에 발에 좀(무좀)이 슬지 않는다고 한다. 섣달그믐 무렵부터 즐기던 연날리기는 정월 대보름까지 한다. 대보름이 되면 ‘액연(厄鳶)’이라 하여 연 몸통이나 꼬리에 ‘송액(送厄)’ 또는 ‘송액영복(送厄迎福)’ 등의 글자를 써서 멀리 날려 보낸다. 예전에는 대보름 이후에도 연을 날리는 사람이 있으면 고리백정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액을 불러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