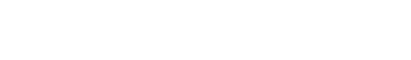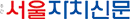지난 일요일 동네 미용실에서 이발을 했다. 거울을 통해 머리를 손질해 주는 예쁜 아가씨를 보면서 '내가, 아니 우리나라 남자들이 언제부터 미용실을 다녔더라’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 골목길에 으레 하나씩 있었던 이발관이 사라진 지는 오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박노해였다.
1998년에 사노맹 사건으로 7년간의 수감(收監) 생활을 마치고 나온 박노해를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옥중수필집《사람만이 희망이다》를 가지고 한 대형서점이 마련한 '저자와의 대화’ 자리에서였다.
내 눈앞에 나타난 박노해는 티셔츠에 콤비, 청바지 차림이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댄디(dandy)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멋쟁이였다. 얼굴에는 수염을 길렀고, 헤어스타일도 참 근사했다. '노동의 새벽’을 쓴 '얼굴 없는 노동자 시인’, 사노맹의 수괴(首魁)로 죽음 문턱까지 갔던 혁명가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박노해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강조했다. '군사독재’ 치하이던 1980년대와, 민주화가 됐고 소련․동구(東歐)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1990년대 후반에는 자신의 생각도 달라져야 하고, 그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였다.
박노해가 이발관에 안 가는 이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박노해는 자기의 헤어스타일 얘기를 했다. 그는 “이 머리, 미용실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10대, 20대가 아니면 남자들이 미용실에 가는 게 흔치 않을 때였다.
“늘 미용실을 이용하는데, 어쩌다가 머리 다듬어야 할 때를 놓친 적이 있어요. 마침 이발관이 눈에 띄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발사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머리모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스타일이 내게 어울린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영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만의 스타일에 굳어 있어서, 손님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자기가 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날로 변화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후로 나는 이발관에는 안 갑니다.”
'사회주의 혁명가’ 박노해는 이때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대해 이야기한 셈이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는 시장에서 도태(淘汰)될 수밖에 없다는 것 말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정부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사라져가는 동네 이발관을 구하기 위해 <이발관 살리기 특별법>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법으로 남자들의 미용실 이용을 금하고, 이발관만 이용하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이발관 반경 500m 이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미용실이나, <박준뷰티랩> 같은 체인점 형태의 대규모 미용실이 들어서지 못하게 금하는 방법도 있겠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피식 웃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법이나 제도들이 꽤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나 SSM 규제 같은 것이 그것이다. 동네 이발관 구하겠다고 남자들에게 이발관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이나 동네 상권(商圈) 보호하겠다고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나는 풀무원 두부하고 삼립식품의 '빚은 떡’ 먹고 싶다. 왜 내 자유를 빼앗나? 정부가 뭔데 내가 내 돈 내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나? 내가 왜 같은 값을 내고 질 떨어지고 제조사도 알 수 없는 걸 먹어야 하냐는 말이다.”
'사회주의 혁명가’ 박노해도 동네 이발사를 위해 자기 헤어스타일을 희생하려 하지는 않는다. 냉정하지만, 그게 '시장의 논리’다. 박노해도 몸으로 실천하는 그 '시장의 논리’에 '비즈니스 프렌들리(bussiness friendly)’를 외치던 MB정권이 도전하고 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