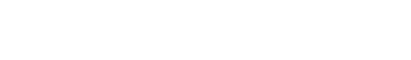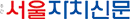한 축산업자가 자식 같은 소를 굶겨 죽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이었다. 얼마나 한우의 산지가격이 형편이 없으면 저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하는 안쓰러움도 있지만 그의 과격함에 당혹스럽기도 하다. 우리는 1년 반 전의 배추파동을 기억한다.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만원을 넘었고 소비자들은 아우성쳤다.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격 폭등과 폭락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정부로 향했다. 그러면 정부는 마치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이들의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나선다.
가격관리에 대한 유혹은 대단하다. 특히 생필품의 가격이 불안정하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관리의 유혹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는 정권은 없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해 가격관리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시장의 힘을 이기는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된 것도 결국 가격관리의 불가능함에 기인한 것이다. 계산가격(shadow price)의 논쟁은 이를 입증한다. 프랑스 대혁명기의 우유 파동,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Hindenburg Program이나 영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가격관리 정책들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는 역사가 말해준다. 서민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인류 최초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시장친화적인 정권'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등장한 이 정부가 시장경제에 가장 반하는 가격관리에 나서는 것은 역설적이다. 그것도 어느 정권보다 요란스럽게 말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초 생필품 52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소란을 떨었다. 그러나 이들 품목들은 지난 3년간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더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관료가 특정 품목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시하였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음직한 가격통제 정책이다. 뒤늦게 가격통제가 아니라고 부산을 떨었지만 말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어떤 정권이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세련된 정책 구호를 선점하는 좌파 진영과는 무척이나 대조적이다. 서민에게 다가서려는 몸짓이야 탓할 수 없지만, 가장 반시장적인 이런 용어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개탄스럽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서민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좌파 진영의 논객들이 우호적인 것도 결코 아니다. 이들은 가격책임 실명제에 냉소적인 비판을 쏟아낼 뿐이다. 지지세력도 잃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 세력의 저항도 누그러뜨리지 못하니,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정책 참모들의 정치적 감각을 탓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이 정부를 향해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구사하라고 주문한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의지’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호들갑'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힘을 믿어라
한우의 산지가격이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 않자 대형 매장과 소비자들이 직접 유통마진을 없애려는 시도가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시장의 힘이다. 시장의 이런 조정과정을 통해 한우의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면 한우 소비는 증대할 것이다. 이것이 축산업자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정도(正道)이다. 정부는 섣부른 시장개입 대신 산지와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가 없는지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