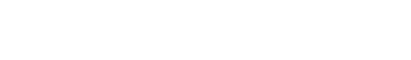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된 일본 작가 오마키 신지(44)의 작품 ‘리미널 에어 - 디센드’다. “공기가 하강하면서 구름이 소멸하기 직전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시각화한 작업”이라고 미술관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방한한 오마키 신지는 “내 작품은 공간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주요 테마로 한다. 이 작품은 1996년 시작돼 2003년 본격적으로 선보인 작품”이라며 “시간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소개했다.
옆 공간에는 2000개 이상의 플라스틱 빨대를 엮은 구름형상의 작품이 천장을 뒤덮고 있다. 바닥에는 한지에 콩기름을 바른 장판지가 돌돌 말려있다. ‘유선사(遊仙詞)’란 제목의 이 작품은 서울 출생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자란 지니 서(52)가 제작했다.

작가는 특히 허난설헌의 시에서 나타난 도교적 예술관에서 영감을 받아 그 모습을 구조적인 조형언어로 나타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허(虛)’한 느낌도 들지만, 그런대로 볼 만하다.
한때 TV 수리공이기도 했던 호주작가 로스 매닝(38)이 형광등과 모터 팬, 전선 등으로 만든 키네틱 조각 ‘스펙트라 더블’도 만날 수 있다. 빛의 3요소인 빨강(R), 초록(G), 파랑(B)에 노랑을 더한 형광등은 끝에 달린 모터 팬으로 움직인다. 각 색의 형광등은 무작위로 회전하며 다채로운 빛의 합성을 보여준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기도 한다.
로스 매닝은 “원래는 사운드에 관심이 많았으나, 이런 관심이 빛으로 이어졌다. 일차적으로 보이는 빛은 강렬하지만, 벽을 비추는 색은 부드럽고 나중에는 하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색깔별로 구역을 나눠 설치했다. 관람객의 시선을 따라 빛을 혼합시키기도, 분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아바프’는 엘리 수드브라크(37)와 프랑스 출신 크리스토프 아메이드 피아송(42)으로 구성됐다. 1994년 수드라브라크가 만들었으며 둘은 2005년부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메이드 피아송은 “이 작품은 우리 작업의 극히 일부다. 애초 다른 공간을 위해 설계한 벽지를 서울관에 맞게 재설계했다”면서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도구”라고 말했다.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물질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 작품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통역하는 매개체라고 보면 된다. 관객이 전시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름방학시즌(7~8월)에는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관람객이 마스크와 색 테이프로 작품제작에 참여해 이미지 경험을 공유하는 전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2015 현장제작설치 프로젝트 ‘인터플레이(Interplay)’ 전으로 8월 23일까지 서울관 제6전시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