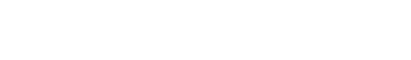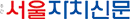봄똥
늙은이가 봄똥을 먹고
양지바른 텃밭에
봄똥이 되었다
성질 급한 배추흰나비가
봄똥에 앉더니
코를
움켜쥔다
봄날이 다 가도록 똥을 못 싼 것들은
얼굴이 노랗다
굵고 짧게 살 것인가
짧고 길게 살 것인가
우문에 현답을 알고 있는
봄똥에게
무릎 꿇고 한 수 배워야겠다
■ 詩作 Note ■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봄이라는 계절에서 자연과 인간 존재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탐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봄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인 계절이다. 사라지는 것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변화가 무엇인지를 시를 통해 표현하고 싶었다.
‘늙은이가 봄똥을 먹고 / 양지바른 텃밭에 / 봄똥이 되었다’는 첫 구절은 인간 존재의 순환을 암시한다. 봄똥이 된 늙은이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다시 태어나고, 그것이 텃밭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담았다.
‘봄날이 다 가도록 똥을 못 싼 것들은 / 얼굴이 노랗다’는 봄날처럼 짧은 시간을 보내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은유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못 싼’것들이 후회로 남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했다. ‘우문에 현답을 알고 있는 / 봄똥에게 / 무릎 꿇고 한 수 배워야겠다’는 구절에서는, 자연의 순환을 알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봄똥에게 배워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서도 많은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봄똥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존재가 결국 큰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다.
결국 우리가 자연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시이다. 봄이라는 계절과 봄똥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다. 작은 존재에 담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