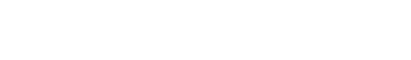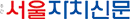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비창’은 그가 1893년 말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작곡한 작품으로서, 이 때문에 ‘비창’은 마치 차이콥스키를 위한 레퀴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 작품은 블라디미르 다비도프에게 헌정된 것으로, 일설에 의하면 그는 차이콥스키의 연인이었다고 한다.

뮤지컬 ‘모리스’는 모리스와 클라이브가 서로를 인식하는 첫 만남에서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등장시킨다. 모리스는 시골 출신의 중산층으로, 대학에 입학하면서 선배인 클라이브를 만나게 된다. 클라이브는 귀족 계급인 젠트리의 일원으로 모리스에게 상위 계급의 삶의 양식을 하나씩 알려주고, 차츰 가까워진 둘은 서로의 마음이 상대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달으나 결국 모리스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사회적 지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클라이브에게 거부당한다.
대학에 갓 입학한 모리스는 자신에게 신사다운 삶을 알려주는 클라이브가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열어준 곳은 실상 꽉 막혀있는 억압과 순응의 공간이었고, 클라이브는 닫힌 세계로의 문을 열어주었기에 결과적으로 모리스는 클라이브와 함께 있는 한 닫힌 세계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클라이브는 극이 진행되는 내내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며 그가 문을 열 때는 오직 자신의 세계로 모리스를 초대할 때뿐이다. 그러나 그 문은 모리스라는 단 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었고 정작 그 문을 통해서 클라이브 자신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문이다.

이후 대학을 그만두고 회계사가 된 모리스는 자신의 성향을 부정하며 치료를 받으려 하나 괴로울 뿐이다. 그러다 연락이 끊겼던 클라이브에게서 급작스러운 청첩장을 받게 되고 ‘친구’로서 클라이브의 저택에 초대된 모리스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냥터지기 알렉을 만나게 되어 다시 사랑에 빠진다. 알렉은 모리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새로운 세계로 떠날 것을 제안하나 클라이브는 모리스를 만류하며 이곳에 남아 친구로서 함께 하기를 간청한다.
알렉은 담백하고 순진하며 자유로웠던 대학 시절의 모리스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다. 모리스가 클라이브를 통해 닫힌 세계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그는 현재 클라이브를 닮아있는 모리스에게 끊임없이 그가 잊고 있었던 자신을 일깨운다. 모리스와 클라이브가 읽었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랑을 본래 하나였던 존재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려는 그리움으로 정의하며, 그렇기에 사랑은 결국 쪼개진 자아가 투영된 존재를 찾으려는 결핍이자 그에서 비롯된 완전해지고자 하는 욕망이다. 과거에 모리스는 클라이브를 자신의 나머지 반쪽으로 여겼으나 그러기엔 둘은 너무나 달랐고, 이제 모리스는 폭풍우 속에서도 문을 열어젖히는 알렉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 클라이브를 모리스가 되려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아로, 알렉을 모리스가 버리려 했으나 끝내 버릴 수 없었던 자아로 본다면 모리스의 선택이 어느 쪽을 향할지는 극명하다.
잘 있어, 클라이브! 경쾌하게 인사한 모리스가 떠나고, 클라이브는 혼자 남아 피아놀라를 연주한다. 그때 그는 육체만은 살아 있되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장례식에서 직접 비창을 연주하며 잃어버린 연인에게 그 곡을 바친다. 닫힌 문과 열린 길의 경계에서 떠난 자는 완전함을 얻었고 남은 자는 영원히 결핍된 껍데기로서 그곳에 있으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 되뇌면서.
*본 리뷰는 기자가 관람한 회차(4월 12일) 캐스트 기준과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