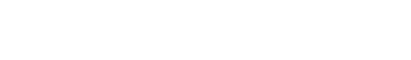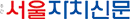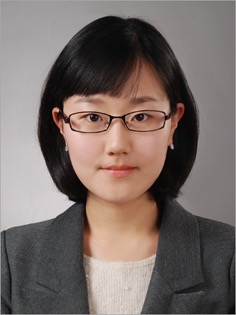
어느덧 여름의 중반을 향해가고 7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다. 무심코 이달의 달력을 보다 보니, 날짜 밑에 쓰여있는 작은 글씨가 눈에 띈다. ‘7월 27일, 유엔(UN)군 참전의 날’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7월에는 두 번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7월 초 유엔군 창설 결정으로 미군의 스미스부대가 첫 파병된 일이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수많은 희생을 뒤로한 6·25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된 일이다. 바로 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2013년부터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하여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은 전투부대 파병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의 총 198만 명을 한반도에 투입한다. 1950년 9월 초, 한반도의 90%가 북한군에게 점령되어 낙동강 이남 지역까지 수세에 몰린 극한의 상황에서 국군과 함께 유엔군은 사생결단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다. 이처럼 낙동강 전선이 튼튼하게 버틴 덕분에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여 파죽지세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여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엔군은 전사·사망 40,803명, 부상 103,460명, 실종·포로 9,769명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있었다.
6·25전쟁은 지금까지도 분단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자 현실이다. 이러한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는 매년 7월 27일 유엔국 참전용사와 각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유엔 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를 개최해 미래세대에게 6.25 참전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계승하고, 대한민국과 유엔 참전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유엔군 참전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얼마 전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방한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는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에 감사한다. 한국을 위해 평생 기도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이역만리의 이름 모를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룩될 수 있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스러진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유해가 잠들어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는 6·25전쟁의 상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백발의 참전용사들이 있다. 그들을 끝까지 찾아서 기억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 친구였던 젊은 참전용사들을 생각하며, 뜨거운 여름의 한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