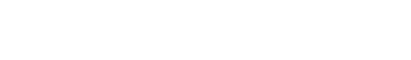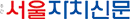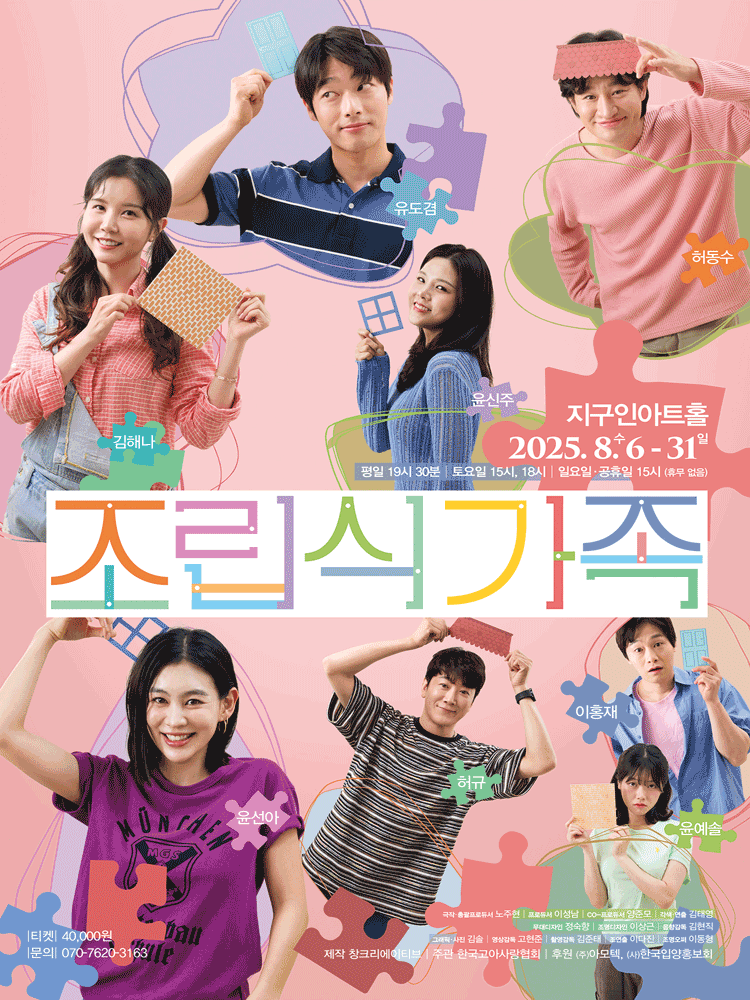
많은 보육원 퇴소생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장과 집을 마련해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결핍과 아픔이 켜켜이 쌓여 있다.
연극 <조립식 가족>은 보육원을 퇴소하고 살아가는 30대 청춘들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를 무대 위로 꺼내 놓았다.
2021년 고양어울림누리 초연, 2022년 대학로 공연에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던 이 작품이 2025년 여름, 더 깊어진 이야기와 확장된 무대, 더블 캐스팅으로 돌아왔다.
보육원에서 태어나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정식', 사회적으로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마흔도 되지 않았는데 네 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모세', 남편이 허구한 날 바람을 피워대는 것도 모자라 시댁에서 구박까지 받아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정식이네 집에서 빌붙어 사는 술주정뱅이 여인 '정미', 보육원에서 태어났지만 불안한 삶을 이어가며 매번 연애에 실패하는 '희정'.

연극 조립식 가족은 보육원을 퇴소한 정식, 모세, 희정 세 명의 30대 청춘과 갈 곳 없는 한 여인이 설날을 함께 보내며 '가족'이라는 단어의 이미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서로 다른 상처와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대화 속엔 불시에 툭 튀어나오는 상처의 조각들이 있다.
이들의 대사나 상황을 통해 보육원 퇴소생들이 겪어야만 하는 사회 제도의 허점이나 심리적 공황이 엿보인다.
가족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걸까, 아니면 살아가며 하나씩 맞춰가는 걸까.
그 순간 관객은 '가족이란 무엇일까', '나는 어떤 가정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기족이란 태어나면서 주어진 울타리라 믿었는데 지금의 가족은 더 이상 태어날 때 주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꼭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살면서 서로를 선택하고 유지하려 노력하는 관계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누가 내 가족인가?'라는 질문이 곧 '누가 내 삶을 함께 지탱하는가?'로 바뀌고 있다.
꼭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 아무 말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나만의 조립식 가족을 완성해 간다.
연극 조립식 가족은 연극. 뮤지컬에서 입지를 다진 배우들이 모여 웃음과 눈물이 오가는 한 설날의 식탁을 생생하게 구현한다.
무대는 반딧불이 모티프, 무지 인형 등 상징적인 장치로 희망과 연대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아직도 수 천명의 아동들이 보육원에 입소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나 아동에게 부모는 우주와 같은 존재이며 우주가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보육원에서 단체로 양육되어진다.
한 아동이 보육원에 입소해 퇴소하기까지 길면 18년을 보육원에서 지내다 퇴소한다.
대학로 연극 <조립식 가족>은 무겁지만 따뜻하고 유쾌하지만 무직한 메시지가 담긴 작품으로 아직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제자리를 찾고 있는 퇴소생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상처 위에 웃음을 얹어주는 올여름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연극 <조립식 가족>은 8월 한 달 동안 대학로 지구인 아트홀에서 공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