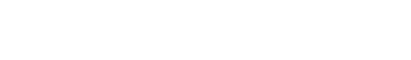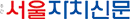러시아 국민 작가 고골의 『외투』에서 시작된 쇼노트의 신작 ‘데카브리’를 보고 나니, 무대 위의 이야기가 단순한 시대극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민과도 닿아 있음을 느꼈다. 배경은 1825년 데카브리스트의 난 이후 검열과 탄압이 일상이 된 19세기 러시아지만,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시대를 넘어선다.
주인공 미하일은 한때 문학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청년이었지만, 현실에서는 황제의 검열관이자 수사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체제 안에서의 성공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는 뜻밖에도 과거 자신이 쓴 책 <말뚝>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 농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이 책을 통해 미하일은 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꿈과 신념을 떠올리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현재의 자신과 치열하게 부딪힌다.
무대 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미하일이 결국 <말뚝>을 금지시키면서도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이었다. 단순히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양심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옆자리에 앉은 관객들까지 숨을 죽이고 집중하는 순간, 이 연극이 던지는 울림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아카키와 알렉세이라는 두 인물은 각각 문학을 지키려는 순수한 열정과 권력의 냉혹함을 보여주며, 미하일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다가온다. 세 배우가 주고받는 긴장감 어린 대사와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단순한 역사극이 아닌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 살아 숨 쉰다.
공연장을 나서며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건, 결국 지워지지 않는 글의 힘이었다. 미하일이 검열관으로 살아가며 지우려 했던 자신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외투 속에,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억압 속에서도 문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 연극은, 우리가 왜 여전히 책과 예술을 찾아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말해준다.
만약 검열과 자유, 권력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인간의 고뇌를 무대 위에서 만나보고 싶다면, ‘데카브리’를 꼭 추천하고 싶다. 단순히 러시아의 한 시대를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경험이 될 것이다.
작품은 11월 30일까지 NOL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공연된다.
※본 기자는 손유동 미하일, 김찬종 아카키, 알렉세이 유태율 회차로 관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