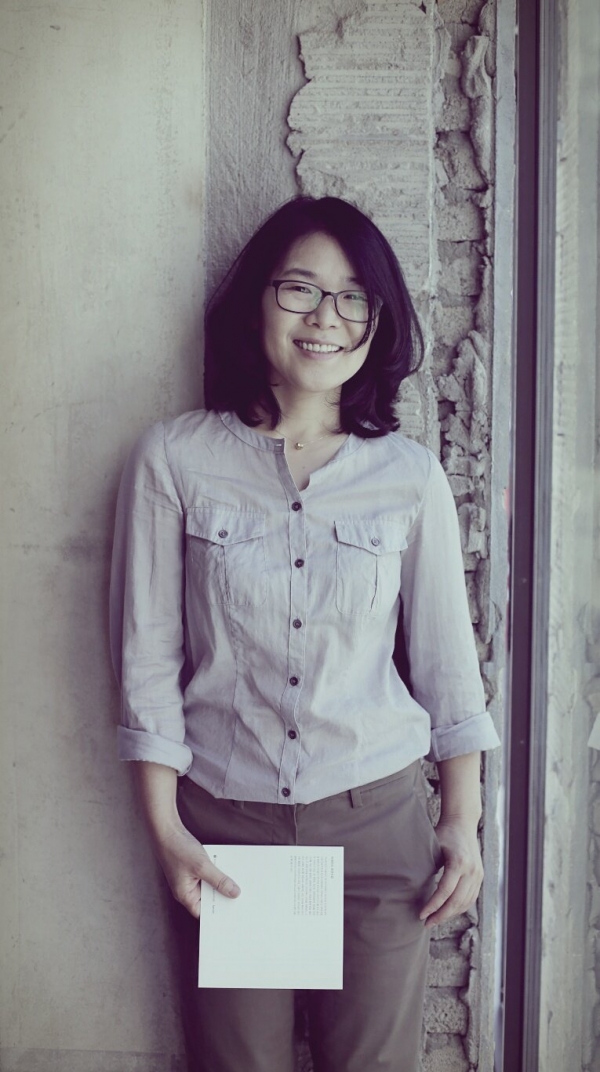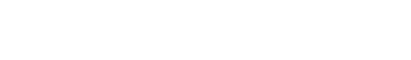오후 4시
이강순
한낮의 햇살이 정수리를 돌아 서쪽 창으로 기울 즈음이다. 학교 앞 골목에는 하교하는 아이들로 왁자하다. 나는 카잔차키스의 산문집을 읽고 있다. 꿈 영혼 해방 자유인이라는 대명사와 그리스인 조르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의 고향 크레타섬이 그리워지는 시간이다. 잠시 책을 던져 놓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한다. 커피 향이 집안 곳곳에 감돈다. 그즈음 학교에 갔던 아이는 집으로 들어선다.
커피 잔 속으로 아이의 이야기가 재잘재잘 담긴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은 잠시 주춤한다. 모닝커피와는 사뭇 다르다. 아침 커피가 부드러움 속의 따스함이라면 오후의 커피는 나른함 속에 오는 달콤함이다. 생기가 돈다. 커피는 식어가고, 나는 아이를 위한 간식을 준비한다.
개망초가 방천을 하얗게 뒤덮은 유월 오후, 키 큰 버드나무가 서 있는 먼지 풀풀 나는 신작로를 걸어서 하교했다. 땡볕에 뻘겋게 달궈진 얼굴로 집으로 들어서면 나를 맞이해주는 건 똥개 누렁이와 마루에 널브러진 닭똥 서너 모둠이었다. 책가방을 던져놓고 교복도 벗지 못한 채 지푸라기로 닭똥을 치우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물 한 바가지를 떠 와 마루 사이에 끼인 닭똥을 씻어내야만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들어섰지만 나를 기다리는 건 엄마가 아니라 가축들의 자유로운 훼방이었다. 먹을거리라곤 아침에 주워놓은 주근깨 다닥다닥 붙은 못생긴 살구 몇 개와 삶은 감자가 전부였다. 시디신 살구는 먹기 싫었다. 식어 빠진 감자는 더 먹기 싫었다.
식은 커피를 손에 들고 아이를 바라본다. 아이는 막 쪄낸 감자를 먹는다. 똑같은 감자라도 막 쪄낸 분나는 감자에 주스를 곁들인 맛과 다 식어 빠진 감자에 찬물 한 바가지의 맛을 어찌 비교하랴. 아이는 스마트폰을 쉼 없이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집중하고 있다. 제대로 감자 맛을 느끼며 먹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식어 빠진 감자 이야기를 해 준들 그때를 느끼기나 할까.
혼자 피식 웃는다. 웃음 꼬리에 엄마와 어린 내가 보인다. 뒷골 밭 땡볕 아래서 콩밭을 매고 있을 엄마, 등성이에 올라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불러내던 나. 엄마를 불러댔던 것은 일종의 반항이었다. 배는 고픈데 눈에 보이는 간식거리가 맘에 들지 않아서다. 밭을 매는 엄마가 아닌, 하교하는 나를 반겨줄 엄마, 나를 기다려 간식을 챙겨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엄마가 필요했으리라. 내 기분은 상관도 없이 엄마의 레퍼토리는 언제나 같았다. 찬장 안에 있는 감자 먹고 숙제하라는 그 말. 들릴 듯 말 듯 한 그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는 때때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내 기억속 풍경의 한 장면이다.
아이는 간식을 먹고, 또 다른 가방을 챙겨 학원으로 향한다. 행여 학원 버스를 놓칠까 봐 조마조마하며 서둘러 아이를 내보내고 나는 내려놓은 커피를 한 잔 더 가져와 창을 향해 턱을 괸다. 아이를 태운 노란 버스는 바삐 달려가고 다시 바빠지는 아이와는 상관없이 나의 오후는 평온해진다. 커피 한 모금 속에 내려앉는 오후가 더없이 여유로워진다. 커피 맛이 더 좋다. 어쩜 커피를 마시는 일은 나를 들여다보는 일인지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얼 해야 하는지, 내밀히 나를 향해 고개를 드는 시간. 오롯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또 다른 내가 엄마가 된 내 앞에서 가방을 던져놓고 간식을 먹고 다시 또 가방을 챙겨 학원으로 내빼는 뒷모습은 영락없는 내 모습이지만 현실의 강은 이쪽과 저쪽이다. 함께 흐를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즈음 아이는 학원에 도착하여 수업을 시작할 것이다. 또 다른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다. 여유롭게 쉴 틈도 없이 학원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깝다.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다. 강둑에는 지금 개망초가 흐드러지고, 금계국이 산천을 노랗게 물들이는데 계절에 피는 꽃조차 분간할 수 없는 자연에 무지한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잠깐 고민한다.
긴긴 여름 오후 마루에 엎드려 숙제하고, 내가 후려친 장대에 맞아 다리를 절고 있는 수탉에 대한 걱정도 필요 없는, 오로지 공부에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백번 천 번 나을 수도 있으리라.
커피 잔을 내려놓고 읽다 만 카잔차키스의 산문집을 다시 든다. 하필 마루에 올라와 똥을 싸 놓고 가버린 닭들에 대한 배신에 치를 떨던 시절이 울컥 그립다. 긴 장대 마루에 걸쳐 놓고 까딱거리며 책장을 넘기는 나를 상상한다. 원수 같은 닭들과의 전쟁은 기억도 나지 않고 커피 맛보다 더 달콤한 오후가 펼쳐질 것이란 생각만 가득하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오후 4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