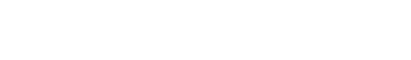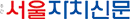천리 길 흘러온 강물
류 인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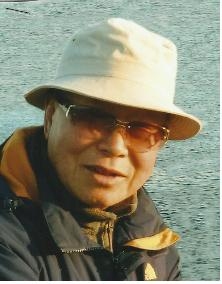
비릿한 갯바람 코끝에 진하고, 갈매기 떼 허기진 가락이 밀물을 재촉하는 오후시간이다. 번들거리는 알몸 드러낸 채 길게 누웠던 시커먼 갯벌 덮어가며 둑 밑까지 차오른 서해 바닷물이 천릿길 흘러드는 금강(錦江)물을 마중하고 있다. 민물과 짠물이 서로 만나 몸을 섞는 곳, 시작인가. 끝인가…. 자연의 섭리는 신비일 뿐이다.
대서(大暑)의 노기(怒氣)까지 이글대는 7월의 4째 주, 친구 따라 예정 없이 찾아간 금강하구 둑에서 내려다보는 강물과 바닷물의 합수(合水)풍경은 자못 사색을 유혹한다. 흔들리기조차도 귀찮은 듯, 폐선의 낡은 깃발이 가끔씩 흐느적대는 포구 변두리 허름한 횟집에 자리 잡는다. 천막지붕의 후끈한 복사열이 땀 밴 등짝타고 흘러내려 불쾌지수까지 끈적대지만, 그래도 일상을 벗어난 해방감이기에 토막 난 전어 몇 마리가 시장기 겹친 소주잔마다 감칠맛을 더해준다.
굽이굽이 흘러온 성취감의 안도일까. 더 갈 곳 없는 마지막의 절망일까. 아니면 유한의 시공을 벗어나 무한의 시공으로 드는 새로운 경지의 시작일까. 구름끼리 만나도 번갯불 번쩍대며 뇌성벽력 쳐대기 일쑤이건만, 강물과 바다가 합쳐지는 우주의 향연치고는 너무도 조용하고 경건하다.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몸을 섞는 신비의 현장을 체험하기는 처음이다. 섞인다는 것은 화합이 아닌가. 새로움을 창조하는 상생의 일치다. 일생을 오로지 흐름으로만 살아온 금강으로선 마지막이고, 멈추고 정지된 채 염장(鹽藏)으로 영생해야 될 바닷물로선 새로운 시작이다.
부처님을 만나기 위한 수도승의 길고도 먼 수행 길 같은 강물의 여정…. 숱한 역경의 곡절을 겪어내며 바다만을 향해 치열하게 흘러온 길고도 먼 길, 높은 자리도 싫고 앞지르기도 거부한 채 조금도 야합하거나 역행함 없이 오로지 낮은 곳만을 향해 굽이굽이 흘러온 겸손과 순리, 파란만장한 그 물길은 천로역정(天路歷程)….
어찌 우리들의 일생과 무관타 하랴. 당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 되돌아본 적 있는가. 무상한 희로애락 굽이굽이 넘고 돌아 오늘에 이른 게 우리가 아니던가. 인생은 죽음 찾아 흐르고, 강물은 바다 찾아 흐름이 본성이다. 막히면 넘어야 하고, 절벽에선 곤두박질도 쳐야 한다. 갈리고 찢기면 다시 모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폐수 독극물에 오염되면 사경을 헤매면서도 흘러야 한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오매불망 본성의 끈을 잡고 존재의 흥망을 향해 강물은 바다로 흘러야만 한다. 바다에 이르면 흐름도 멈춘다. 바다는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홍수가 져도 넘침이 없다. 생사를 포용하고, 선악을 포용하고, 애증을 포용하고, 세상만사 모두 포용하면서도 바다는 흐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한의 곳이고 영원의 곳이다.
바닷물은 자전과 공전으로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며 해(日)와 달(月)의 성리학적 차원을 넘나든다. 바다에 들어온 강물은 더 이상 흐름을 멈추지만, 그 이름은 온갖 생명의 원천을 머금은 구름이 되어 비로 내릴 것을 기약한다. 강물이 조금도 서성거림 없이 태연하고 유유하게 바다로 들어가는 이유다.
금강(錦江)은 전북 장수군의 어느 산골 뜸 봉 샘에서 시작된다. 작은 도랑과 개울로 흘러내려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며 군계(郡界)도계(道界)를 지나 굽이굽이 낯선 산하 천릿길을 달려 서해 바다에서 마지막을 묻는다. 생각해보면 흐름의 순리가 처연하다. 불현듯 내 인생의 끝자락이 환영(幻影)되어 아련하게 다가선다.
걷고 달리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평생을 세상사에 부닥치며 쉼 없이 살아왔건만, 이제는 더 갈 곳 없는 서해바닷가 목로주점에 앉아 턱없는 너스레나 지절대고 있으니 흘러온 강물과 무엇이 다른가. 자신의 생애를 아무 불평 없이 바다에 바치는 강물의 진리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깨닫는가. 나는 오늘 강물의 마지막을 보았다. 시작은 끝이고, 또 끝은 다시 시작의 원점이 되는 윤회의 원리도 깨달았다. 왜 이 세상에 신앙이 존재해야 하는지도 어렴풋이 떠오른다.
무상한 변천을 증거 하듯, 멀리 대안(對岸)에서 연기 멎은 장항제련소 굴뚝이 우두커니 나를 쳐다보고 있다. 한때 금(金)은(銀)동(銅) 고급 금속재를 생산해내면서 황금만능시대를 선도하던 굴지의 산업시설도 이젠 시대에서 밀려난 초췌한 허상뿐이다. 다하면 끝이고, 끝나면 사라져야 하는 게 존재의 이치가 아니던가.
금강은 화려했던 백제역사의 시발점이다. 낙화암에서 몸을 날렸던 3천 궁녀의 애달픈 원혼들이 아직도 백마강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소정방이 넘나들던 금강 뱃길에서 망국의 한을 흐느끼고 있다.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가던 길도 금강이고,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뺏고 빼앗기면서 오랜 세월 창검을 겨누고 싸워온 전장도 금강이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스스로 짜디짠 염분으로 절여지는 까닭도 동반한 역사의 줄거리들을 영원히 썩지 않도록 염장해두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면 썩어도 바닷물은 억겁을 머물러도 썩지 않는다. 드넓은 하늘처럼 바다는 영원히 푸르다. 아마도 다시 흐르고 싶은 강물의 염원이 배었을지도 모른다. 구름으로 승화해서 비로 내려와 다시 강물 되어 흐르고 싶은 윤회의 염원인지도 모른다.
부질없는 욕망의 끈에 매달려 영원히 살기를 기구하지만 어느 날이면 흙 속으로 들어야 하는 유한의 인생. 궂은 심사 모두 접어 가슴에 안고 바다로 들어가는 강물이듯, 우리도 쉼 없이 다가오는 미래의 끝을 생각해야 한다. 강물의 끝, 바다의 시작, 바로 우리들 인생의 윤회가 아니던가.
94년 수필 등단. <바람인가 세월인가> 등 수필집 13권.
국제PEN클럽 한국회원, 한국 문인협회 회원.
PEN클럽 한국본부 대전지역 부위원장 역임. 한국 문인협회 대전지회장 역임.
is1025@krpos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