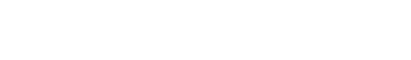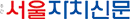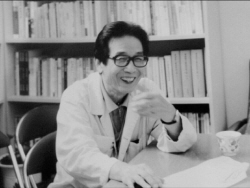
명절은 만남의 의미이다. 흩어져 살던 친척을 만나고, 소원했던 정겨운 친구 얼굴도 본다.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세월이 많이 변했다. 찾아볼 손윗사람이 없다. 가슴이 저민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 소를 몰고 산에 들어 풀을 먹기는 사정을 두고 ‘소띠기’라고 한다. 방언이다. 점심을 먹기가 바쁘게 소를 몰고 나가면 해넘이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온다. 하루해가 어쩌면 그렇게 지루한지 한해여름 방학쯤의 길이라 여겨진다. 죽기보다 더 싫은 노역이다. 큰 동생과 3살 터울로 자랐다. 숙성하여 덩치가 나와 비슷했다. 가위, 바위, 보로 승부내기를 걸어 지는 쪽이 산으로 가서 소를 먹인다. 이기는 쪽은 소 풀을 베어온다. 재주껏 모아보면 몇 시간 안에 망태기(풀 담이)에 찬다. 어쩌면 그렇게도 싫은 소띠기기였는지! 그런 고역을 추석날에는 벗어날 수 있어 그날이 기다려지는 터이다. 그날 소는 진종일 나무그늘에 매어 있다가 해거름 풀려나 소죽 한통으로 배를 채운다. 그 일은 어른들 몫이다. 그래서 조무래기들에게 이날은 지상의 천국이었다. 마을 산을 돌아다니며 노는 자유, 그게 그렇게도 즐거웠다. 우리들의 시간을 만끽하러 아침부터 집을 나선다.
오늘의 집결지는 내시(면소재지) 앞산이다. 콩서리에 운이 좋으면 알밤까지 횡재할 수 있는 장소다. 7명이 모였다.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다. 1,2,3등은 양반대접 받는다. 4,5등은 땔감을 준비해서 콩을 굽는다. 꼴찌와 끝 꼴지는 콩을 서리해 오는 중책이 돌아간다. 그날 나는 운수 나쁘게도 꼴찌 등에 걸렸다. 주인이 강 건너 마을에 사는데 물이 불어 강 길이 막혔기에 콩서리 하는 데 위험성은 제거 된 상태다. 불콩(검정콩)만 골라서 뽑았다. 콩의 밑 둥을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살짝 밟으며 뽑아내면 감쪽같아 표가 나지 않는다. 제법 많은 양을 뽑았다. 콩밭 한쪽에 제법 넓은 빈터가 눈에 들어왔다. 마을의 누구네 소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콩을 뜯어먹은 자국이다. 양반 대접의 1,2,3등 중 칼을 소지한 사람이 나무 가지를 잘라온다. 뽑아온 콩대를 올려놓고 구을 들것을 마련하는 일이다. 너무 짧거나 가늘면 불합격이다. 화상을 입을 수도, 굽는 도중에 약해서 타버린다. 가지가 길고 단단한 밤나무가 일등 재목이다.
생콩을 굽는데 도가 튼 공신이 있었다. 그는 희성稀姓을 가졌고, 야산의 등성이에 가로막힌 독농가에 산다. 1년에 잘해야 두세 번 만난다. 그래서 반가운 친구로 분류된다. 그는 콩이 익느라 ‘피리-’, ‘피리-’ 소리를 내면 한불을 지펴서 속까지 익게 한다. 그러다가 보면 줄기에 달려 있는 콩까지보다 떨어진 쪽이 많았다. 콩알이 딱 알맞게 영글었고 실하다는 소리다. 잿불이 삭기를 기다리던 그는 윗옷을 벗어 훌- 훌- 바람을 일구어 잿부스러기를 날려 보낸다. 알맞게 익은 콩알과 깍지 콩이 알몸을 들어낸다. 까만 콩알을 물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깍지 콩은 순식간에 동이 난다. 고소하고, 구수하고, 달짝지근하니 별미였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키들- 키들- 웃는다. 이때쯤 콩 안에 든 돌을 와작 씹는 불운아가 생긴다. 희성의 독농가 친구가 잘 익은 콩알 속에 찔러 넣어 둔 모래알을 입에 넣은 것이다. 입언저리로부터 검게 화장이 되어 있었다. 오늘의 점심은 별미 검정콩 서리다.
할 일이 있다며 두 동지는 빠지고 나머지 또래는 산등성을 타고 돌며 우리들만의 가을을 구가한다. 민둥산이어서 조망의 폭이 광활했다. 기분이 짱이다. 겨루기 중엔 솔방울 멀리 보내기도 있다. 밤나무의 가늘고 긴 가지를 잘라 와서 끝에 솔방울을 꽂는다. 봄부터 자란 햇것이라 빠근히 꽂아진다. 요령을 부려 던진다. 꼭 바다 낚시꾼이 바늘 추를 던지는 폼이다. 솔방울은 시야를 벗어나 어디엔가 떨어졌다. 기막힌 사연이 담긴 편지를 써서 꼬리연처럼 매달아 날렸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다시 ‘묏등’으로 모여 말 타기 놀이를 한다. 마을이 가까운 동산에는 어디이고 마을 사람 무덤이 있다. 이 둘레를 ‘밋둥’이라 불렀다. 한창 재미가 붙을 쯤 인 데 부르는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자세히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앞산 나무에 매어 둔 소를 풀어 와서 소죽을 먹이라는 명령이다. 그 냥 웃는 낯으로 대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아버지는 손주 대하기를 원수 보듯 했다. 속으로야 아니었겠지만 우리 생각은 그랬다. 좋았던 기분은 순간 홍수에 씻기듯 사라져버린다.
다음날 늦은 오후였다. 장터에 사는 박 씨 성 가진 어른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한쪽이 비어 있는 콩밭을 보며 수확을 망쳤다며 아까웠던 속마음까지 덧으로 계산하여 콩 도주를 물리러 온 것이다. 박 씨 양반을 돌려보낸 할아버지는 나는 죽일 놈 잡듯 다그쳤다.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웠다.
“올 추석 효도는 내년 추석에 두 배로 받을게”, “아범아, 선물은 택배로” 어느 도에 사는 부모들이 내 건 피켓 문구였다. 우환 역병이 만들어낸 변조 세시풍속이다.
그날 할아버지가 콩 도지를 물었는지. 또 얼마를 줬는지는 기억에 없다.
경자 년 출생은 쥐를 닮아 잘 산단다. 그 경자 년 추석을 이렇게 맞는다. 찾아뵐 윗어른도 반가움을 나눠볼 정다운 친구도 딱히 없다. 인생을 일러 수류운공水流雲空이라 했던가?
약력
소설가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강남문인협회 고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 서울시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