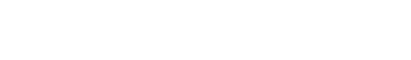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1809~1882)이 저술한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1859)의 제14장 “요약과 결론”은 글자 그대로 이 명저의 핵심 이론들을 개괄하고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특히,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장은 적어도 세 가지 음미할 만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다.
“생명이란 원래 창조자가 여러 가지 능력과 함께 하나 혹은 한두 가지의 형태 속에 불어넣었던 것이며, 이 행성이 확고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순환하는 동안 아주 단순한 하나의 시작을 기점으로 가장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무한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진화를 해왔고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다는 이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있다.”
(원문: There is grandeur in this view of life, with its several powers, having been originally breathed by the Creator into a few forms or into one; and that, whilst this planet has gone cycling on according to the fixed law of gravity, from so simple a beginning endless forms most beautiful and wonderful have been, and are being, evolved.)
이 문장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마침내 “진화하다(evolve)”는 말이 나온다는 점이다.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하면 다윈을 떠올리고, 다윈이라고 하면 『종의 기원』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제외하면, 진화라는 말은 이 책의 어디에도 없다. 그 말이 딱 한번 등장하니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다윈은 왜 이 말을 맨 끝에 배치했을까?
다윈은 자신의 이론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진화라는 말 대신에 몇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수정된 혈통의 하강(descent with modification)”도 그런 말이다. ‘descent’는 ‘내려오기, 하강, 혈통’ 등의 뜻이지만 우리말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어구는 ‘자연선택에 의해 유리하게 수정된 형질들은 사라지지 않고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뜻이다. 생명에 이러한 유전적 신비가 없다면 진화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제4장 “자연선택, 즉 적자생존” 편에는 진화라는 말 대신에 종의 “분기(divergency)”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다윈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을 “유익한 개체적 차이와 변이는 보존되고 유해한 변이는 버려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강한 것이 아니라 잘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다”고 말한다. 자연의 힘은 각각의 수많은 생명체들에 작용할 뿐 아니라 그 개체들의 내부기관과 체질적 차이에도 작용한다. 이를테면 어떤 식물은 화려한 꽃잎의 변이를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곤충을 유인하고, 그래서 자신의 꽃가루를 더 많이 퍼트릴 수 있다. 요컨대 유리한 변이를 자연적으로 선택한 결과, 화려한 꽃잎을 가진 새로운 식물의 종이 분기된다.
인간도 종의 분기를 이뤄낸다. 한 떼의 말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부족은 그 중에 주로 빨리 달리는 말을 골라서 새끼를 낳게 하고, 그 새끼들 중에서 더 잘 달리는 말을 다시 종자로 삼는다. 반면에 다른 부족은 잘 달리는 말보다는 힘이 센 말을 골라서 종자로 삼는다. 이렇게 몇 백 세대가 지나면 잘 달리는 말과 힘이 센 말, 즉 완전히 다른 두 변종의 분기가 일어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잘 달리지도 못하고, 힘도 세지 못한, 어느 부족의 선택도 받지 못한, 그 중간 어디쯤의 종은 그 수백 세대가 지나는 동안 멸종에 이르고 만다는 점이다.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왜 자연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할까? 더군다나 자연은 인간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다윈은 종의 분기와 멸종 과정을 논증하기 위해 “생명의 나무(Tree of Life)”라는 도표를 제시한다. 어떤 종이 잘 달리는 말, 힘이 센 말, 그리고 멸종된 말로 분기하는 데는 1천 세대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1천 세대의 분기 과정은 하나의 횡선으로 표시된다. 이 도표는 이러한 분기가 14번 반복되는 과정을 14개의 횡선으로 나타낸다. 출발선에서 11종이 10개의 횡선을 지나는 동안 2종은 5종으로 분기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종들의 분기와 멸종이 일어난다. 또한, 그 5종도 나머지 4개의 횡선을 지나며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거나 소멸한다. 이 “생명의 나무”는 종의 진화와 소멸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데… 다윈은 1천 세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 그 14개의 횡선들은 각각 100만 세대 혹은 1억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1억 세대는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일까? 45억년이라고 추정되는 지구의 나이는 또 얼마나 장구한 세월일까? 이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자연선택은 아주 느리지만 한시도 멈추지 않는 손길로 모든 생명체들의 분기와 멸종을 지배한다. 이에 자연의 생산물들은 그 형질 면에서 인간의 생산물들보다 훨씬 더 진정한 것이다. 사실 인간이 야생의 동식물을 가축이나 농작물로 길들인 것은 기껏해야 1만년도 안 된다. 요컨대 자연이 1억 세대 또는 그 이상 동안 축적한 생산물들에 비하면 인간의 생산물들은 참으로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다.
위 마지막 문장에서 흥미로운 또 다른 어구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시작을 기점으로(from so simple a beginning)”라는 표현이다. 이 말은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강력한 함의를 내포한다. 다윈은 최초의 생명체가 어떤 형태였는지 언급하지 않지만 그 단순한 시작을 기점으로, 즉 태초의 한 생명체로부터 무한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진화를 거듭했고, 그러한 진화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단언한다. 이에 수많은 생명체들의 분기와 멸종 과정을 거꾸로 14억 세대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의 공통 조상에 이르지 않을까? 실제로 사람의 손, 박쥐의 날개, 돌고래의 지느러미 등이 갖고 있는 골격의 유사성은 이들이 모두 어떤 공통 조상의 후손일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도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 아니라 생명의 총체적 진화 과정의 일부라는 선언이다. 이러한 생명관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당시 사회적 통념에 대한 충격적인 도전이다. 왜냐면 모든 생명체를 하나하나 창조하고 마지막 날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신화이거나 허구가 되기 때문이다.
위 마지막 문장에서 끝으로 음미해볼 만 한 말은 “창조자(the Creator)”라는 표현이다. 이 창조자라는 말도 신(God)을 지칭한다. 하지만 창조자라는 말 대신에 자연(Natu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전체적인 문맥에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이 단어가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과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다만 신이라는 단어가 좀더 종교적 뉘앙스를 갖는다면 자연이라는 단어는 좀더 과학적 뉘앙스를 갖는 것 같다. 이에 다윈이 창조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종교와 과학의 중간 어디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한다. 분명한 것은 창조자라는 단어의 함의가 결코 아담과 이브를 개별적으로 창조한 신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튼 『종의 기원』의 마지막 단어 “evolved”는 귀납적 논증의 화룡점정이다. 이는 진화론에 격렬한 논쟁의 불을 댕긴다. 사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최초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래즈머스 다윈(Erasmus Darwin)이나 라마르크(Lamarck)도 이미 진화론을 주창했다.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은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반론과 비판에도 살아남는다. 이는 이 저서가 담아내고 있는 수많은 생물학적 또는 지질학적 증거들과 이에 기반한 과학적 논증의 힘 덕분이 아닐까 한다. 왜냐면 이 책이 출판된 지 160여 년이 지났지만 다윈의 논증과 그 증거들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